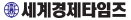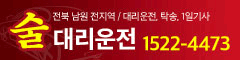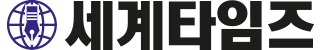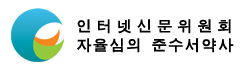|
| ▲ |
칠흑보다 어두운 밤 267명이 탑승한 상황에서 자칫 잘못했으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어서 등골이 오싹했다. 다행히 11여 분 안에 현장에 도착한 해경에 의해 3시간 만에 전원을 구조했고, 30명이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았으나 중상자는 없었다. 해외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신속한 사고 수습을 지시했고, 초기 대응도 비교적 빠르게 이뤄졌다. 그러나 이번 사고가 남긴 경고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 밤늦게 승객과 선원 267명이 모두 구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야 온 국민이 가슴을 쓸어내렸다. 사고 지점이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전남 진도군 조도면 관매도 인근 해역으로부터 불과 50km가량 떨어진 곳이었기 때문이다.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만큼 해상 안전 체계를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이번 사고도 안전 불감과 부주의 탓으로 여겨지는 인재(人災)가 분명해 보인다. 항해 위험 구간인데도 선장은 자리를 지키지 않았고, 항해사는 휴대전화로 뉴스를 보는 딴짓을 했었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로 그 많은 사람이 희생됐는데도 현장의 해태와 무사안일은 달라지지 않았으니 참으로 기가 찰 일이다. 사고 발생 지점인 신안 앞바다는 1,000개가 넘는 섬이 모여 있어 비좁은 구간을 오가야 하는 곳이다. 당시 여객선은 22노트(45㎞/h)로 목포를 향해 운항 중이었고, 항로 변경 지점을 지나 3분 후에 사고가 발생했다. 이런 난항(難航) 구간에서 기본 규정을 무시한 채 운항했다는 사실이 어이없고 개탄스럽다. 세월호 참사 이후 강화된 안전 규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선사의 관리·감독, 승무원 교육, 해양수산부와 해경 등 관련 기관의 사전 점검까지 안전 사슬의 고리가 느슨해지지는 않았는지 철저히 살펴봐야 한다. 어처구니없는 이번 사고의 원인과 경위를 철저히 규명해 책임을 묻는 것은 기본이다.
해경에 따르면 이러한 ‘협수로(狹水路)’ 구간에선 자동항법장치를 끄고 항해사가 수동으로 배를 조종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항해사가 자동항법장치를 켠 채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변침(變針 │ 방향 전환)’ 시점을 놓쳤다고 한다. 약 1,600m 앞선 지점에서 선제 변침을 했어야만 했는데도 겨우 100m를 남기고서야 상황을 알아차렸다는 것이다. 운항에 집중하지 않은 채 3분 동안이나 휴대전화를 보느라 방향 전환 시기를 놓쳤다는 것이다. 함께 있었던 인도네시아 국적의 조타수도 제 역할을 하지 않은 채 이를 지켜만 봤고, 「선원법」 제9조(선장의 직접 지휘)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선장은 좁은 수로를 지나가는 때에는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여야 한다는 의무가 있음에도 근무 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조타실을 비웠다. 결국 사고 선박은 통상적인 항로에서 벗어나 족도에 좌초하고 말았다. 썰물로 펄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선박은 좌초 직전까지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교신도 없었다. 최초 사고 신고도 승객이 했고, 사고 직후 20분간 배에서는 상황 설명도 없었다고 한다.
세월호 참사가 올해로 11주기이지만 해상사고는 좀체 줄지 않고 있다. 304명의 희생 앞에서 전 국민이 처절한 절망감을 느꼈고, “다시는 이런 비극적 인재(人災)가 없도록 하겠다.”라며 사회적 다짐이 이어졌다. 수많은 법과 제도가 정비됐지만, 시간만 지났을 뿐 변한 게 없다. 우리 사회의 안전 시계는 여전히 멈춰 서 있거나 매우 더디게 움직이고 있을 뿐이다. 세월호 이후에도 비슷한 인재가 지속 반복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2025년 대한민국 해상 안전의 현주소라는 데 아연실색(啞然失色)하지 않을 수 없다. 작년 11월 8일 제주 해역에서 어선이 침몰하여 14명이 사망·실종됐고, 한 달도 채 못된 지난해 12월 4일 경주 앞바다에서도 가자미 어선이 전복돼 7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참사가 있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 5명 이상의 인명피해를 유발한 해상사고만도 무려 18건이나 발생했다. 무려 11년 동안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라는 우리의 다짐들을 공허하게 만들었다. 안전한 사회는 단 한 번의 혁신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매 순간 재난의 기억을 잊지 않고, 작은 위험 신호에도 귀 기울이는 지속적인 성찰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안전불감증’이라는 고질병과 ‘사고 공화국’이라는 오명(汚名)에서 이제는 벗어나야만 한다.
한편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대형 카페리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를 운항하던 중 휴대전화를 보는 등 딴짓을 하다 배를 좌초시킨 일등항해사와 조타수가 구속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1월 22일 중과실치상 혐의로 긴급체포한 일등항해사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증거 인멸·도주가 우려된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부실한 안전관리로 인한 인재 참사는 반드시 막아야만 한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무책임한 행동으로 사고를 낸 개별 승무원에게 책임을 묻는 것뿐 아니라 구조적으로 구멍이 나 있는 부분은 없는지 면밀하고 촘촘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항로 이탈과 관제 부재가 발생한 원인과 그에 따른 대책이 나와야만 한다. 차제에,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경각심도 한층 더 높여야만 한다. 세월호뿐 아니라 무안공항 참사의 아픔도 아직 체 가시지 않았다. 또다시 대형 인명피해가 벌어지지 않도록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사고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데에 총력을 경주해야 한다.
일찍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Napoleon Bonapart)’는 “우리가 어느 날 마주친 재난은 우리가 소홀히 보낸 지난 시간의 보복이다.”라고 말했고, ‘요한 크리스토프 프리드리히 폰 실러(Johann Christoph Friedrich von Schiller)’는 “가장 큰 죄는 무관심이다.”라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구조적 미비점을 알면서도 방관(傍觀)하고 방치(放置)하며 방기(放棄)하는 행태야말로 사회가 짊어져야 할 가장 엄중한 책임을 방임(放任)하는 해악(害惡)이다. “준비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By failing to prepare, you are preparing to fail)”란 ‘벤자민 플랭클린(Benjamin Franklin)’의 선각(先覺)을 떠 올리고, 곡돌사신(曲突徙薪)의 심정으로 거안사위(居安思危)와 초윤장산(礎潤張傘)의 지혜 그리고 유비무환(有備無患)과 상두주무(桑土綢繆)의 혜안으로 우리 사회에 해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안전참사(安全慘事)’만은 반드시 막아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을 단순히 몇몇 개인의 일탈로 치부해 처리해서는 안 된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와 해운업계는 수많은 안전 강화 대책을 내놨고, 여객선이 훨씬 엄격한 통제 아래 운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사고는 그 많은 제도와 규정이 얼마나 허술하게 현장에 적용되고 작동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냈고 안전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차제에 근무 교대 체계가 안전 운항에 적합한지, 자동항법장치 사용 기준은 제대로 교육되고 실행으로 옮겨지고 있는지, 선사의 운항 시스템과 관리·감독은 실효성에 문제가 없는지를 전면 재점검해 봐야 한다. 현장의 부실한 운항이 확인된 만큼 감독기관의 책임 역시 철저히 규명해 발본색원(拔本塞源)해야 한다. 이번 사고가 비극으로 이어지지 않은 건 순전히 운이 좋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운에 기대는 안전은 결단코 안전일 수 없다. 재난은 ‘설마’하는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다.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지 않는다면 재난은 언제든 반복될 수밖에 없다. 안전은 아무도 보지 않는 때에도, 사소한 규칙 하나라도 지켜질 때, 비로소 담보되고 보장된다. 안전은 습관이고 체질이어야만 한다. 해상 안전을 근본부터 다시 세우지 못한다면, 한국 사회는 또 한 번의 비극 앞에서 통한의 눈물을 흘리게 될 뿐이다. 그러한 치둔(癡鈍)의 우(愚)는 다시는 없어야만 한다.
[저작권자ⓒ 전북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